15세기에 나타난 자본주의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무한 이윤획득에 의해 세계 경제는 불균등하고 불공정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의 힘이 거세지면서 각종 모순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현대 경제의 중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쟁점들의 핵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논쟁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 몰라도 무방한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경제학 논쟁이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은 보통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의 주요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본지 선임기자 현재욱의 저작인 「보이지 않는 경제학」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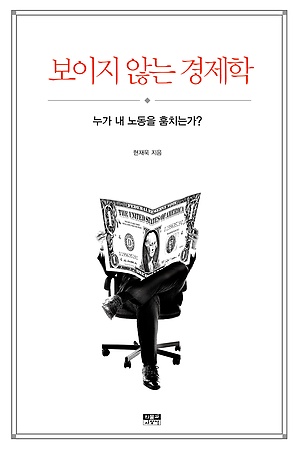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다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 1842~1924이 한 말이다. 케임브리지대학교에 경제학과가 생긴 때는 1903년이다. 케인스의 스승이기도 한 마셜은 대학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경제학을 독립된 학과 과정으로 개설했다. 그는 ‘경제학economics’이란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기도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경제학은 도덕과학moral science의 한 분과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학이 다루는 문제를 개인의 영역으로 좁히면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이고,국가 혹은 세계 범위로 시야를 넓히면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이다. 다시 말해 내가 카페라테를 마실지 아메리카노를 마실
지 선택하는 문제는 미시경제학이고, 최저시급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따지고 들면 거시경제학이다. 경제학을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다.
한자어로 썼을 때의 ‘경제經濟’는 경세제민經世濟民 또는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줄임말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간다 다카히라神田孝平라는 일본인이 서양의 문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고전을 뒤적여 만든 용어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라는 뜻인데, 현대적 의미의 경제보다는 정치 쪽에 가깝다. 사실상거시경제는 정치의 영역이다(제9장에서 정치와 경제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할 것이다).
경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economy’는 ‘oikonom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집안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즉 ‘집사’라는 뜻이다. 집안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ality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그레고리 맨큐에 따르면 경제학은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9 나는 이 말을 ‘부富를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지는 학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람직하다’라는 말은 가치판단을 요구한다. 물리학이나 생물학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경제학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모두 아우르는 학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는경제학에서 가치판단을 제거함으로써 물리학처럼 시빗거리가 없는 학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학이 생겼다.
경제학은 사람의 활동을 다룬다. 그러다 보니 물리학처럼 간결한 공식과 법칙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고전주의 물리학’, ‘신고전주의 물리학’ 같은 용어를 들어보았는가? 새로운 지질학 이론에 대해서 ‘매우 진보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어떤 물리학자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성향일 수는 있다.
그러나 물리학 자체는 보수 또는 진보와 무관하다. 우리는 그런 특징을 ‘가치중립적value-free’이라고 말한다. 물리학에는 ‘학파’라는 것이 없다. 분자물리학, 천체물리학처럼 세분화된 분야는 있어도 통화주의
monetarism나 재정주의fiscalism처럼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고 다른 처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제학만큼 논쟁이 치열하고 이견異見이 분분한 학문도 없다. 그 이유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경제적 선택에는 대개 손익損益이 따른다.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 배분방식에 따라 이득을 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긴다. 같은 사회현상이라 해도 입장이 다르면 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자유방임을 신봉하기도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할 수도 있다. 노동자의 연대와 계급투쟁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물리학에서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상충하는 설명이 있을 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경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참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인 경우와 둘 다 거짓인 경우. 그럴 때 학계는 어느 한쪽이 ‘진리’로 검증될 때까지 ‘가설’로 보류해 둔다. 경제학으로 넘어오면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을 각각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뇌과학 전문가인 박문호 박사의 지론에 따르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를 본 적이 없다. 그들은 거의 모든 문제에 정통한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앨프리드 마셜의 견해대로 경제학이 인간의 일상생활을 다룬다고 치자.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려면 먼저 인간 자체를 잘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을 잘 모른다. 동물학, 심리학, 뇌과학을 다 동원하더라도 인간은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계속>
※ 이 연재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저자(현재욱)와 출판사(인물과사상사)의 동의로 게재한 글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5〉경제의 자기장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4〉경제란 무엇인가?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3〉경쟁은 이로울 수 있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2〉생산의 발견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내 삶은 훌륭한가?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7〉호모 에코노미쿠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8〉경제로 세상을 이해하자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9〉부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0〉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1〉국내총생산과 국가의 부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2〉노동은 재화에 응축된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3〉돈이 부의 전부인가?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4〉노동의 몰락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5〉지대 추구는 부를 생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