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기에 나타난 자본주의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은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자본가들의 무한 이윤획득에 의해 세계 경제는 불균등하고 불공정해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강대국의 힘이 거세지면서 각종 모순적 요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현대 경제의 중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쟁점들의 핵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논쟁을 우리가 알아야 할까? 몰라도 무방한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경제학 논쟁이 경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정책은 보통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의 주요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본지 선임기자 현재욱의 저작인 「보이지 않는 경제학」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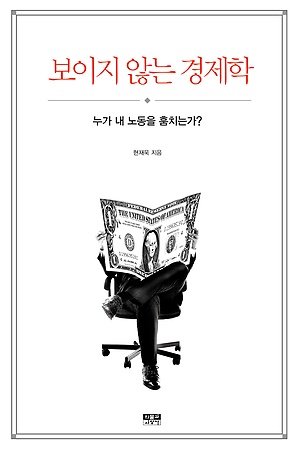
부의 원천은 노동이다
애덤 스미스의 위대함은, 인류사에서 대부분 노예나 농노의 몫이었던 노동을 국부國富, wealth of nations의 원천으로 격상한 데에 있다. 만약 후세의 위정자들이 스미스에게서 참된 배움을 얻고자 한다면 노동자
를 함부로 대하거나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많은 경제학자와 정치가에 의해 오독되거나 나쁘게 이용당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에 대한 오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야경국가론夜警國家論이다. 널리 알려진 것과 달리 스미스는 ‘국가는 도둑이나 지키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거꾸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부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 사법, 공공사업, 교육 같은 일은 정부(국왕)의 의무임을 명확히 밝혔다. 특히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스미스의 지적은, 자본권력의 무한 폭주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와는 결이 달라도 한참 달라 보인다. 그가 1776년에 발표한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은 국가의 보호무역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리라는 믿음을 전파하려고 쓴 책이 아니다.
『국부론』은 노동labour에 대한 명쾌한 규정으로 시작한다. “연간 노동의 생산물이 연간 소비를 공급한다. 한 나라 국민의 연간 노동은 그들이 연간 소비하는 생활필수품과 편의품 전부를 공급하는 원천이며, 이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은 언제나 이 연간 노동의 직접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 생산물과의 교환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구입해온 생산물로 구성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의 원천은 노동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부wealth는 돈money과 동의어가 아니다. 스미스는 구체적으로 “생활필수품과 편의품”이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말로 번역하면 ‘재화’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돈은 곧 금이었다. 영국은 1717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금본위제를 시행했다. 그전에는 금과 은을 모두 화폐로 사용했다. 애덤 스미스는 금과 은이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국부를 구성하는 한 요소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금과 은을 국부의 전부라고 여겼던 중상주의 정치가들과는 사고의 출발점이 달랐다.
애덤 스미스의 강의를 좀 더 따라가 보자. 한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묻는 것은 그가 재화를 얼마나 향유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다. 그 재화의 대부분은 타인의 노동에서 얻어 와야 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가진 부의 수준은 그가 지배할 수 있는, 혹은 구매할 수 있는 노동의 양量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부의 총량은 노동의 총량과 같다. 이것은 금융가들이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다. 일을 하면 부유해지고, 일을 안 하면 가난해진다.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잘사는 나라가 되고, 일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가난한 나라가 된다. 무엇이든 일을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비하여 조금이라도 낫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한 사회의 부가 늘어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증진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기여도가 같을 때 보상의 수준이 같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임금이 다르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있는가? 예를 들어 노동자 (가)와 노동자 (나)가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두 사람의 숙련도는 같고, 생산요소 가운데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50퍼센트다. 두 사람이 10시간 일한 결과 총 20만 원 상당의 최종 생산물이 만들어졌다. 최종 생산물이 나오기까지 두 노동자가 기여한 가치는 10만 원이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5만 원씩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가)는 정규직이어서 6만 원, (나)는 비정규직이어서 4만 원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자유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결과를 놓고 보면 (나)의 몫에서 1만 원을 덜어서 (가)에게 얹어준 셈이다. 이게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동일노동에 대한 임금격차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기업 혹은 사용자에게 이 같은 방식의 임금 결정권을 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아마도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 (가)와 (나)의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가)를 3명 고용하는 비용보다 (가) 1명에 (나) 2명을 고용하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을 훔치는 행위이고, 이를 합법화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다시 되새겨 보자. 국가는 노동자를 포함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국가가 그 의무를 포기한 시장은 더 이상 자유시장이 아니다. 일찍이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주장했듯이, 그런 국가는 엎어져야 한다. 존 로크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조건을 걸고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았다.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국민에 의해 파기될 수 있다(사회계약설). 만약 존 로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같은 주장을 펼쳤다면 극우 정치세력에게 ‘종북좌파’로 매도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 연재는 스트레이트뉴스가 저자(현재욱)와 출판사(인물과사상사)의 동의로 게재한 글입니다.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관련기사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9〉부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8〉경제로 세상을 이해하자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7〉호모 에코노미쿠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6〉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5〉경제의 자기장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4〉경제란 무엇인가?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3〉경쟁은 이로울 수 있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2〉생산의 발견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내 삶은 훌륭한가?
- 열심히 일할수록 노동이 불편한 이유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1〉국내총생산과 국가의 부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2〉노동은 재화에 응축된다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3〉돈이 부의 전부인가?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4〉노동의 몰락
- [스트레이트 연재-보이지 않는 경제학] 〈15〉지대 추구는 부를 생산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