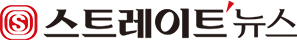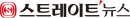퇴직연금 432조원 시대 왔지만...수익률은 제자리
주식 편입 비중 제한 걸림돌...원리금 보장 편중 해소해야

퇴직연금은 432조원으로 커졌지만 도입률 26.4%와 운용 규제로 수익률 개선이 더디다. 해외와 달리 주식 70% 한도 등 제약과 원리금보장 편중이 성과를 훼손했다.
11일 민주영 신영증권 연금사업부 이사는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금형 도입과 운용규제 완화,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제혜택의 자금 환류, 중도인출 제한을 통해 장기 성과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퇴직연금 제도의 목적과 현주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의 목적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두고 있다고 규정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외부 적립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이 근본적 장점이다. 시장 규모는 432조원까지 성장했다. 다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 퇴직연금 도입률(2023년)은 26.4%다. 이는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가 병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 해외 연금제도 대비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점은?
해외에선 운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 이해상충 방지 외 별도 규제가 없다. 반면 한국은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규정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한다. 이 제한이 장기 성과 저조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자산배분의 제약 요인이 된다. 운용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운용 지시는 가입자가 직접 한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해도 모든 가입자의 위험자산 비중이 일률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각 가입자가 운용 목표와 투자성향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제약을 없애야 한다.
▲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가 퇴직연금 운용에 미친 영향은?
자기주도적으로 운용하는 가입자들의 ETF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에 손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장기 운용이 필요한 연금 자산을 과도하게 자주 매매하는 경향이 있다. 잦은 매매는 장기 수익률을 훼손할 수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다.
▲ 수익률이 낮은 근본 원인은 제도 설계 탓인가, 운용 행태 탓인가?
두 가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수익률 저하는 원리금보장상품 편중 탓이 크다. 이는 가입자를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유도하는 제도 설계 때문이기도 하고, 퇴직금은 노후 자금이므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보는 운용 행태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는 모든 가입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기금형 제도’ 도입이 한계를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나?
(투자결졍을 전문가가 대신하는) 기금형을 도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 선택할 수 있다. 잘 모르는 가입자도 반드시 직접 지시해야 하는 현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직접 운용이 어려운 가입자가 기금형을 선택하면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IRP 세제혜택은 실질적으로 작동하나?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만큼을 환급받는다. 이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30%에 가까운 혜택이 된다. 반드시 가입해 세액공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혜택이 소비로 끝나면 노후 준비 효과가 제한된다. 공제받은 자금을 IRP로 환류해 실질적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활성화는 수익률 제고에 효과가 있나?
디폴트옵션의 도입 목적은 수익률 제고다. 그러나 다수가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해 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최소화해 장기 수익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설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 향후 10년을 바라볼 때, 퇴직연금 제도는 어떻게 개편돼야 하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세제 혜택 등 장치를 강화해 노후 생활비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 민주영 이사는…
국내 대표 금융회사를 두루 거치며 ‘연금금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연금분야 베테랑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 키움투자산운용 퇴직연금 이사를 거쳐 현재 신영증권 연금사업부를 이끌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